미‧중 ‘친구이자 라이벌’로 분석한 박한진‧이우탁 ‘프레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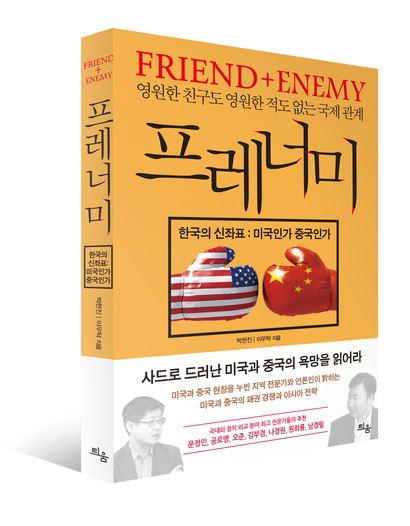
2012년 2월 시진핑 (당시) 중국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언론 LA타임즈는 시 부주석 방미를 다루며 “프레너미가 왔다”고 보도했다.
책 저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는 시각도 비슷하다. 양국 관계가 ‘친구이자 라이벌(혹은 적)’과 유사하다는 거다. 두 대국의 전장은 아시아다.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는 이 같은 기류를 더 강화한다. 저자들은 미국이 아시아로 눈을 돌린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더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의 급부상이다.
경제적으로 아시아는 미국의 최대 수출지역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아시아 수출규모는 대유럽 수출액보다 50% 이상 많다. 반대로 아시아의 대미투자도 지난 10년 간 2배로 뛰었다. 경제가 미국의 ‘아시아향’을 견인한다는 얘기다.
중국이 원하는 건 뭘까? 저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또 다른 하나의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한다. 가정이지만 만일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를 맞으면 중국과의 세계 동반경영을 흔쾌히 받아들일 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기업 사들이기’를 논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저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의 (조립) 공장이 됐지만 일부 기술력 분야에선 아직 1등급이 아니다. 이에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외국 기업을 아예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에는 군사기술과 연동이 가능한 항공분야 회사까지 사들이고 있다. 이는 군사용 드론 기술 발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다. 앞으로 이 지점에서 미‧중 간 소리 없는 전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저자들은 미국 중심 TPP가 한계를 가진다고 본다. TPP 참여국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어지러이 섞여 있다.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불안한 동거상황에 가깝다. 이에 저자들은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글로벌 산업사슬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향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저자들은 경쟁보다 공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권력지형을 재배치하는 선에서 갈등을 관리하리라는 전망이다. 양국은 경쟁관계이 동시에 국익이 일치하는 지점도 많기 때문이다. 상호의존도도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두 대국 사이에 낀 한국 역시 ‘프레너미’란 개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보는 국내의 시선이 양 극단에 있다고 지적한다.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고 정책 아젠다를 개발해야 한다는 거다.
이 책은 대담 형식을 빌려 미‧중 관계를 오밀조밀 드러낸다. 양국 현장을 고루 경험한 지역 전문가와 언론인의 장점이 십분 녹아들어 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 책의 추천사에 4명의 유력 정치인(김부겸, 원희룡, 남경필, 나경원)과 외교관(공로명, 오준) 그리고 학자(문정인)의 이름이 동시에 보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