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미국, BMW는 독일서 레벨3 서비스 각각 출시 확정
현대차 출시 보류···“기술·책임 문제”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각사별로 고도화하는 가운데 서비스 출시 일정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BMW는 올해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서비스를 출시한 반면 현대차는 동등한 서비스의 출시를 보류했다.
자율주행 레벨3은 정해진 구간에서 차량이 사전 설정값을 바탕으로 스스로 운행하는 수준의 기술을 의미한다. 다만 운전자가 시스템의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BMW, 내년 독일서 855만원 받고 자율주행 옵션 제공
BMW는 내달부터 독일에서 신형 7시리즈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신 자율주행 기능 ‘BMW 퍼스널 파일럿 L3’를 유료 선택사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은 6000유로(약 855만원)를 내고 옵션을 장착하면,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최고 시속 60㎞로 자율주행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내년 3월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BMW는 레벨3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고정밀(HD) 지도, 고감도 3D 라이다 센서,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5G 장치 등을 차량에 장착했다.
BMW는 “BMW 퍼스널 파일럿 L3를 이용하는 고객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며 “매일 고속도로에서 체증을 경험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는 내년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미국 일부 주에서 S클래스와 EQS 세단의 고객에게 연간 2500달러(약 327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자율주행 레벨3 서비스 ‘드라이브 파일럿’을 제공할 예정이다. BMW의 퍼스널 파일럿 L3와 마찬가지로 시속 60㎞ 이하 속력으로 정해진 구간에서 차량 스스로 달리는 기능이다. 벤츠는 앞서 지난 6월 미국에서 처음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 출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각)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항에서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동주차 대행 시스템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고객이 주차장에 진입해 차를 세워두면, 차량 스스로 운전자가 사전 설정한 공간으로 이동한다. 2020년 12월 이후 출고된 S클래스를 비롯해 지난 6월 이후 양산된 E클래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일부 고급 모델에 한해 서비스가 적용됐다.

◇미국 언론 “벤츠 레벨3 기능, 테슬라 FSD에 비하면 도약”
두 독일차 업체는 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출시하며 자율주행 서비스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지난 9월 미국에서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을 체험한 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SD) 등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시스템에 비해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현대차그룹은 레벨3 기능 출시 일정을 연달아 보류하며 기술력에 대한 업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지난해 말 출시한 제네시스 신형 G90에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주행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올해 상반기로 미뤘고, 이날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
G90 대신 기아가 이번 하반기 중 대형 전기차 EV9에 같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시점이 연기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술 고도화, 유사시 책임소재 정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3는 개척의 영역, 신중해야”
현대차그룹은 레벨3 기능의 최고 속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전 벤츠나 BMW와 마찬가지로 시속 60㎞를 최고 속력으로 레벨3 기술을 도입하려다, 해당 속력이 국내 운전자 성향과 운행 여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데다, 해당 기능이 활성화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보험 처리에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더 버지에 따르면 벤츠는 드라이브 파일럿 작동 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일부 조건 안에서 짊어진다.
권형근 현대차 R&D품질강화추진위원은 지난 8월 한국자동차연구원 좌담회에 참석해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결함이나 기계적 문제만 책임졌던 완성차 기업에게 자율주행 레벨3 자동차는 운행에 대한 책임까지 가져가야 하는 요소”라며 “우리에게 자율주행 레벨3는 경쟁을 위한 선도적인 기술도입 수준이 아니라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도전으로 신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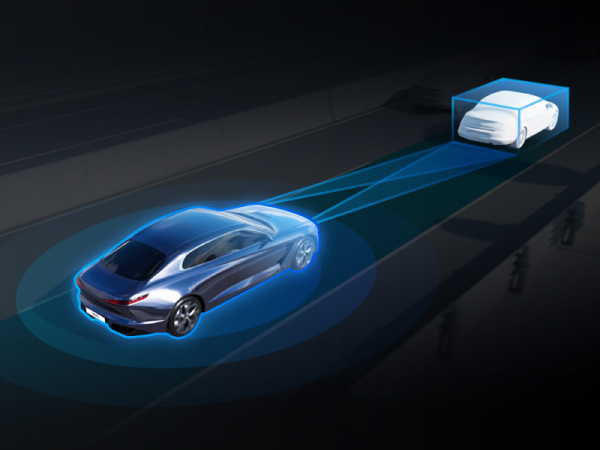
◇업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점 멀어졌지만 다가온다”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완성차 관련 신기술의 미래인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기술력과 유사시 책임소재에 관한 장벽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레벨3 기술 상용화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혼다가 지난 2021년 시속 100㎞로 자율주행 가능한 차량 레전드를 개발했다. 다만 당시 리스 용도로 100대만 생산한 후 현재까지 대량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혼다는 자율주행 가능 속력을 시속 130㎞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안전성 등 출시에 필요한 여건을 충족하는데 힘을 쏟는 상황이다. 오는 2026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개시를 목표를 수립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더욱 현실적인 분야에 투자가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관련 기술이 지속 고도화함에 따라 상용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내년 자율주행 프로세서의 양산 개시를 기점으로 자율주행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며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은 조금 더 연기해 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자율주행이 진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