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니트 미구성 등 무성의 분양관행 바로잡아야…모델하우스와 분양주택 차이도 검증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친척 어르신이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싸늘해진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첨만 됐다 하면 최소 3억은 먹고 들어간다는 입소문이 돌며 올해 서울 청약시장의 흥행 역사를 다시 쓴 사업장이다. 추석연휴 오랜만에 집안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르신의 로또청약 당첨은 다른 이들의 부러움 대상이자 최고의 안줏거리가 됐다.
그러나 뜻밖에도 ‘계약을 할지 말지 수도없이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는 답이 나왔다. 앞으로 살아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선뜻 계약하기 망설여졌다는 이유에서다.
수년 간 주택시장 호황세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소형평형도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는 15억원 안팎이며 중대형은 20억원을 훌쩍 넘는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평생을 일하고도 만지기 어려운 금액이다. 비단 서울 강남이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및 계약은 개인의 일생에 가장 큰 금액을 주고받는 거래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살아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 분양할 전 평형 모든 타입을 구성하지 않고 일반분양 세대가 많은 일부 유니트만 꾸려두는 관행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를 통해 모든 유니트를 구성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모델하우스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수개월 뒤 철거하는 가건축물에 불과하겠지만, 자사 전용 견본주택을 보유한 국내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이상 매번 견본주택을 지을 입지 임대료(특히 주택시장이 흥할 때에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부지 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 수개월 계약에 수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건축비, 내방객을 청약으로까지 이끌기 위한 화려한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니트 구성이 안된 타입을 신청하는 청약자들은 전문가 아니면 쉽사리 이해도 되지 않을 도면에 의존해 청약 및 계약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잘 팔리기 때문이라는 자만심이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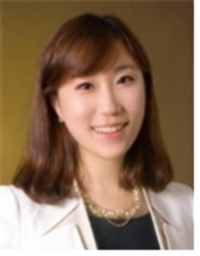
이외에도 모델하우스에서 사진찍으려다 제지당하는 사례도 적잖이 있는데, 이 역시 시정돼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본다. 모델하우스 건설 취지가 추후 이와 같은 형태로 짓겠다는 일종의 계약자와의 약속인데 건축법상 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은 2년 이내다. 즉, 완공 후 입주 시점에는 우리집이 기존 모델하우스와 내장재가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자사 기술 유출 우려를 핑계로 사진촬영 등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시 시공사가 약속을 기만하려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지금까지 청약자들은 입주할 때 아파트 모습이 과거 모델하우스와 전혀 다른 느낌인데도 증거가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하자 투성이인데도 건설사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주 후 속앓이하거나 하자보수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않다. 소비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 또 이에 앞서 건설사 갑질 행태로 신뢰를 잃어가는 업계의 자정노력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