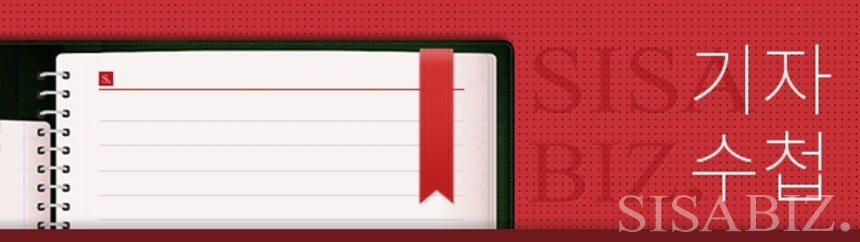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논란이 뜨겁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일부터 직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2월과 9월, 11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이미 600여 명은 회사를 떠났다.
특히 올해부터 출근한 신입 사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사원·대리급 90% 전멸됐다', '29살에 명예퇴직 당했다', '23살까지 희망퇴직을 요구받았다'는 직원들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경영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부진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죽했으면 신입 직원까지 희망퇴직을 받겠느냐는 항변이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자기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을 뽑은 주체는 회사고, 경영진이다.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뽑아놓고 자르는 것은 경영진의 오판이었다. 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또한 회사와 경영진의 몫이었다.
특히 회사 측은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사설 업체를 끌어들여 이력서 쓰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 직업상담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교육도 진행됐다.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흔히 쓰는 방법이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사설 업체까지 동원하는 사례는 드물다는게 업계 반응이다.
여론의 힘은 막강했다. 어떻게 20대 신입사원까지 내쫓을 수 있냐며 분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여론에 밀려 "신입사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왠지 개운치 않았다. 여전히 희망퇴직 신청을 강요받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30~40대 직원들이 떠올랐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쫓겨날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어쩌면 두산인프라코어 사태를 보고 '20대를 짤라선 안 된다'는 접근이 잘못된지 모른다. 그동안 이뤄진 수많은 해고와 명예퇴직에 대해 여론은 침묵했다.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는 정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말에 현혹되기 일쑤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과 함께 분노했다면 두산인프라코어같은 사태는 애초부터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