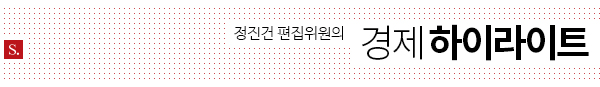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29일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주식이 조금 더 귀해진다는 얘기였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공시 당일 한때 6% 이상 오르기도 했다. 이후 기관투자가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바람에 상승폭을 좁혔지만 그 뒤로도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주가가 오르는 와중에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들까지 계속 이 회사 주식을 내다 판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아무리 살 사람이 있더라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니 누가 판다한 들 그게 이상할 리는 없다. 다만 현재 들고 있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 점은 짚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Fn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조차 6월말 기준 포트폴리오 내 삼성전자 비중이 2.87%에 불과하다. 이 회사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6%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기관들이 한국 간판기업의 주식까지 홀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가 넘는다. 우리가 한국기업이라고 얘기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주가부양책을 내놓은 뒤 나타난 기관들의 태도는 거의 회의가 들 정도다. 회사가 유통주식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기관들이 마구잡이로 주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들고 기다리면 저절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들의 이익이 늘어날 게 빤한데 참지 못하고 물량을 던지는 기관들은 전문가라는 걸 의심케 했다. 그러고도 수수료를 챙길 것을 생각하면 연민을 넘어 화가 날 정도다.
사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지금 한국 주요 기업들 중엔 주가가 장부가를 밑도는 종목이 적지 않다. 그만큼 한국 기관투자가의 주식 기피는 도를 넘었다. 수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세는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얼마 전 한 보험사 CFO와 최근 투자성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그 역시 리스크를 줄이려고 보유주식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보유 물량 자체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남은 주식마저 팔아버리고 채권을 사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대부분 기관들이 그러다보니 국내 증시는 외국인 주도의 장이 돼버렸다.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개인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각각 1조7000억 원대씩 순매수를 했다. 그 반대쪽에서 기관은 4조원이 넘는 물량을 던졌다.
한때 73조원대까지 줄었던 주식형펀드 잔액이 최근 81조원대로 회복됐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시장에서 기관투자가 역할을 꺼내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다.
대조적으로 국내 증시의 외국인 비중은 매도거래나 매수거래 모두 기관을 압도할 만큼 커졌다. 연기금을 제외할 경우 기관 비중은 외국인 비중의 60%도 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시장을 휘두르는 것도 그래서다.
그렇게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보유 주식은 연초 407조원에서 10월말 422조원으로 늘었다. 외국인의 코스닥 주식 보유 규모는 같은 기간 16조원에서 19조원대로 늘었다.
증시는 경제의 축소판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증시를 부양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지금의 리더십은 증시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당국이나 업계의 리더십 모두 마찬가지다.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정착은 지금 정부의 핵심 과제다. 거기에 노령화하는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짐도 지고 있다. 그 해법을 완성하려면 증시부터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선 리더십 혁신을 염두에 둬야 한다. 증시가 이 모양이라면 어떤 노력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