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책은 주택공급 수급 불균형 초래하는 만큼 지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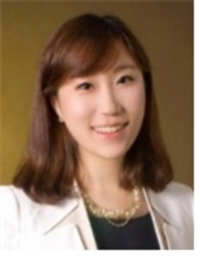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주 국토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했다. 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자금대여를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라는데 이번 발표로 조합은 설계나 총회개최 등 절차에 필요한 수십억 원의 돈을 주민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면 조합은 수익이 줄고 사업성 없는 일부 강북지역은 사업장 담보로 은행권 담보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 해제 구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토부의 발표 닷새 뒤인 지난 12일 서울시도 정비사업장을 확대 압박하고 나섰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해 층수나 디자인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아파트지구, 택지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기로 했다. 통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건축, 교통, 환경 등 보다 복잡한 각종 영향평가 단계를 오랜 기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민간 사업장에 공공의 개입 강도가 세지면서 정비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게 우려된다.
재건축·재개발 옭죄기가 최근 일은 아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평가 강화, 이주시기 조율 등 정비사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수없이 등장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값 상승을 부추긴 하나의 원흉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물론 일부 그런 경향도 일부 있다. 노후는 긴데 사회 안전망이 없다보니 죽을 때까지 가져갈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나서며 정비사업장을 기웃거린 이들이 늘었으니 말이다. 이제 30년 된 녹물나오는 아파트는 10억원을 훌쩍 넘기는게 예삿일이 돼버렸고 이는 전체 주택시장 집갑 오름세를 주도한 면도 일부 있긴 하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투자자들만의 집합소는 아니다. 수십 년 된 구축 주택에 살다가 느즈막이 노후를 새집에서 편안히 보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지닌 어르신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집합소를 부동산 정책은 조이고 틀어막는 억제책으로만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도 않는다. 잠시 누를 수는 있어도 또다시 호재가 생기면 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정비 사업이 위축될 경우 사업예정지가 몰려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미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기존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쯤 되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11년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펴낸 ‘부동산은 끝났다’ 책의 일부 내용이 떠올라 책을 다시 뒤적거리게 된다. 김 수석은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보수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였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주민들의 투표 성향도 바뀌게 된다’고 했다. 그 뒤에는 ‘부동산 정책은 자신들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