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의 어원은 ‘회복하는 곳‘...규제의 틈새에서 찾은 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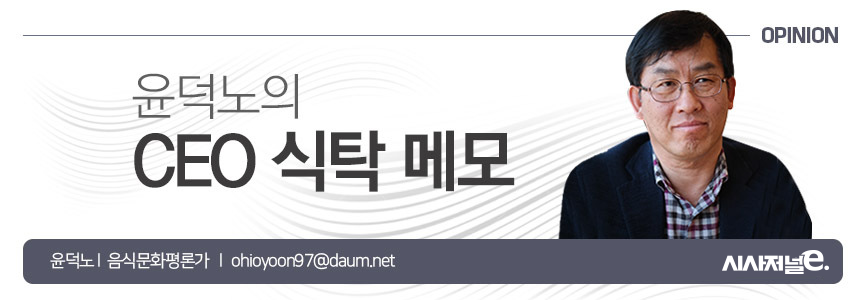
그렇다면 레스토랑의 어원은 음식 먹는 장소라는 뜻일까? 아니다. 엉뚱하게 회복하다, 기운 차린다는 뜻의 영어 단어 Restore가 어원이다. 최초의 레스토랑은 식사하는 곳이 아닌 아픈 사람이 와서 영양식을 먹는 곳, 환자식을 파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레스토랑은 1766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한 세대 전이다. 18세기 유럽은 지금처럼 외식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은 주로 여행자들이었다. 숙박을 겸한 여관의 식당이나 술과 음식을 함께 파는 주점에서 음식을 사먹었다.
당연히 건강한 사람을 위한 음식만 있었기에 여행에 지쳐 몸이 아픈 사람, 위장이 예민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식사 때문에 고생을 했다. 레스토랑은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최초의 레스토랑은 성경 말씀을 패러디해 “소화가 부담스러운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기운을 차리게 해 주리라”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최초의 미국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 혁명 때 집정관의 집사였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쟝 뱁티스트라는 사람이 1793년 보스톤에 레스토레이터(Restorator)을 개업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영양을 섭취해 회복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레스토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음식을 팔았을까? 어떤 메뉴를 내놓았기에 맛있는 요리를 먹는 곳이 아닌.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추스르라고 기력을 회복하는 장소라고 했을까?
초기 레스토랑에서 제공한 음식은 먹기만 해도 힘이 뻗치는 보양식이 아니라 기력 회복제, 레스토러티브(Restorative)라는 이름의 수프였다. 진하게 우려낸 고기 국물에 빵가루나 버섯, 고기와 같은 재료를 넣고 걸쭉하게 끓인 음식이었다. 오랜 여행에 지쳐 기력이 떨어졌거나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레스토랑에서 이런 진한 고기 수프를 먹고는 건강을 회복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단한 부분이 있다. 외식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환자용 회복 음식을 파는 전문식당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18세기에 벌써 환자용 영양식 전용식당인 레스토랑을 개업할 생각을 다 했을까?
당시 사회의 경제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18세기 프랑스는 상인 및 장인조합인 길드가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고기는 정육조합인 길드에 가입한 정육업자만이 팔 수 있었고 빵은 제빵조합에 가입한 제빵업자가 아니면 팔 수 없었다. 여관과 식당도 마찬가지여서 각각의 길드가 자신들의 분야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몸이 아픈 환자가 먹는 특별한 음식은 어느 상인조합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았다. 때문에 특정 길드에 소속된 조합원이 아니어도 영양식 전문점인 레스토랑을 열 수 있었다. 틈새에 시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최초의 레스토랑이 문을 연 지 한 세대 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귀족의 몰락으로 전용 요리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너도나도 상인조합에 소속되지 않아도 문을 열 수 있는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그리고 종전 환자 중식의 영양식 메뉴에 더해 귀족의 요리를 메뉴에 포함시키면서 현재의 레스토랑으로 발전했다. 한 마디로 틈새를 두드리니 큰 문이 열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