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는 성공 비즈니스의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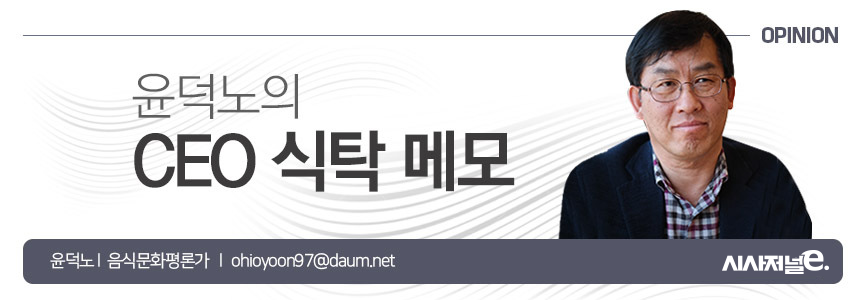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굴을 좋아한다. 그래서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한다는 속담까지 생겼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인 남양에 원님이 부임하면 만사 제쳐놓고 굴회부터 씹지도 않고 훌훌 먹었던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굴과 관련해 한국에 남양 원님이 있다면 미국에는 록펠러가 있다. 굴 요리에 미국 최고 기업인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록펠로 오이스터(Rockefeller Oyster)라고 미국인이 좋아하는 굴 요리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라는데 거창한 요리 같지만 쉽게 말해 미국식 굴 소금구이다. 껍질 채로 구운 굴에 시금치를 비롯해 으깬 채소를 놓고 빵가루와 치즈가루를 얹어 레몬즙과 핫 소스를 뿌려 먹는다.
왜 이름이 록펠러 오이스터일까? 대부호 록펠러가 좋아해서 생긴 이름 같지만 아니다. 1899년 미국 뉴올리언스의 앙트안느 레스토랑에서 개발한 요리로 마늘과 버터로 볶은 채소와 치즈의 맛이 잘 구운 굴과 어우러져 깊고 짙은 풍미를 만들어내는데 진하다는 영어 표현(richness)을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존 D. 록펠러와 연결해 작명했다.
몇 년 전 350만 번째 주문을 받았다니 100년 전통 메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계산해 보면 대략 하루 100명씩 주문을 받았다는 소리다. 뒤집어 말해 미국인도 그만큼 굴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다.
동서양 중 어느 곳에서 굴을 더 좋아할까?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좋은지 묻는 것만큼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의외로 답은 분명하다.
굴은 서양인이 더 좋아한다. 조리하지 않은 생굴 역시 한중일 동양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잘 먹는다. 뉴욕 수산시장에 가면 노량진 수산시장보다 훨씬 다양한 굴을 볼 수 있다. 산지와 종류에 따라 더 세분화해서 진열해 놓는다. 그만큼 굴 맛을 섬세하게 즐긴다는 소리다.
역사적으로도 서양인의 굴 사랑은 유명하다. 1세기 로마황제 아울루스 비텔리우스는 유달리 먹을 것에 탐닉했다. 단지 8개월 동안 황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재임기간 중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약 1,000억 원을 파티비용으로 썼다가 자리에서 쫓겨났다. 맛있기로 소문난 영불해협의 굴을 로마까지 조달해 먹었다. 군인을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고 싱싱한 굴을 실어 날랐기에 굴 값이 같은 무게의 금값과 맞먹었다니 엄청난 돈을 탕진할 만 했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도 마찬가지로 영불해협에서 베르사이유 궁전으로 굴을 실어 나를 만큼 굴에 빠져 지냈고 나폴레옹 시대 주노 장군은 앉은 자리에서 굴 1,000개를 까먹은 것으로 유명하다.
서양 사람들 왜 이렇게 굴을 좋아할까? 이유야 수십 가지 꼽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굴에 대한 환상이 아닐까 싶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력에 좋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음식이자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런 만큼 신화시대 서양인에게 굴은 신들의 음식이었고 로마시대에는 황제의 요리였으며 르네상스 이후에는 귀족과 부자의 잔치음식이었다.
그러니 서양인들이 굴 요리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입맛을 다실 수 밖에 없다. 음식문화를 이해하면 식사자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특히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식사는 최고(the oldest)의 외교수단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한 말이다. 식사는 중요한 비즈니스 수단이고 소통의 도구다. 맛있는 식사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