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공간 중 하나인 익선동, 그곳에서의 시간과 삶을 만나봅니다.

근대식 한옥마을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66번지엔 말(言)이 넘쳤습니다. 90년 넘게 잠잠했던 동네가 젊은이들의 창업으로 갑작스런 변화를 맞은 탓이었습니다. 문제는 넘치는 말 속에 틀린 말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상가를 차린 젊은이도, 집 주인도, 세입자도, 서울시 행정도 그에 맞은 위치와 시선으로 당위를 품었습니다. 한 줄로 꿰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깊게 취재했습니다. 지난 석달간의 이야기를 본지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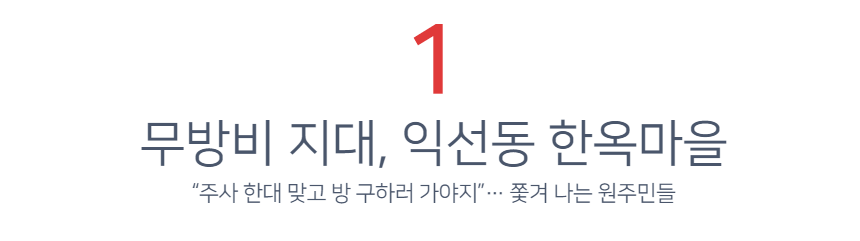
지하철 1·3·5호선이 동시에 지나는 거대 역세권 뒤로 단층 한옥이 밀집한 작은 동네가 나타납니다. 1931년 지어진 이후 한옥 외벽에 붙은 유광타일을 빼곤 과거를 그대로 품은 나이든 동네입니다.
1997년 불기 시작한 재개발 바람도 문화 보존에 막혀 119동 한옥은 달력의 날짜와는 다른 시간을 현재에 새겼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붙인 빤짝이는 요 타일이 집에 돈이 많다는 증거였어”라고 말하는 이모(81) 할머니는 나이든 한옥과 함께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떠나야합니다. 700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6번을 넘게 쉬어야하는 아픈 무릎으로 감당하기엔 동네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네 중심부의 37%가 최근 1년 동안 사람이 살던 집에서 상점으로 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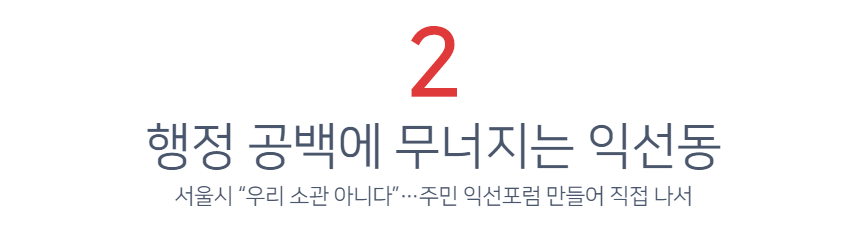
이 할머니의 아픈 걸음을 도와줄 정책도 행정도 없습니다. 종로3가역 4번 출구 건너편 좁은 한옥 골목 초입을 지키던 85살 한옥은 얼마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가 바닥을 이루고 철제 구조물이 담을 이룬 주차장이 됐습니다.
서울시 한옥 담당 공무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014년 10월 한옥보전방안 재검토로 재개발 구역에선 해제됐지만, 관리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서울시 관계부서는 지난해 6월에야 익선동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 익선동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이 할머니가 살 집도, 한옥의 모습도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익선동이 한옥 특성을 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설명도 익선동의 빠른 변화 앞에 무색해질 상황입니다.
오지 않은 자멸에 대해 먼저 생각한 사람은 결국 주민들이었습니다. 올해 초 동네 주민들은 익선동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 협의체인 익선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익선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김란기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익선동이 망가져 가고 있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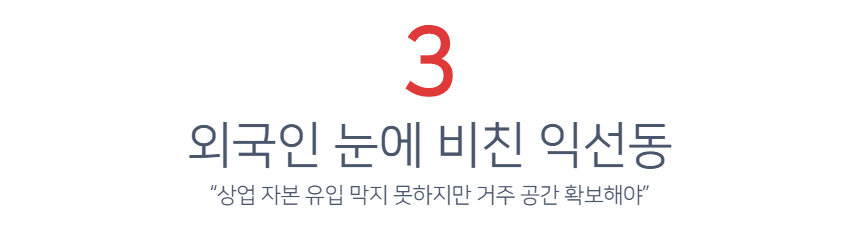
90살 한옥이 자리한 이곳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상점을 열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 변화는 더 빨라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상업화라 규정하고, 상업화가 과거를 씻어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옥이 분명한데 한옥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이 할머니를 밀어낸 돈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시선의 범위를 확장해 익선동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주와 상점이 적절하게 섞인 현 상태를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