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유리한 헤비테일 계약이 화 불러...전문가 “고도계약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육성해야”

우려가 현실이 됐다. 1조원 가량의 돈줄을 죈 해외선주사가 자금 대출 문제 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선박 인도를 거부했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사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금난까지 악화되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의 선박대금방식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자유롭게 늦출 수 있는 ‘헤비테일 대금지급(Heavy Tail)’으로 계약을 체결한 탓에 선주들의 ‘갑질’ 앞에 조선사가 마땅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 ‘무거운 꼬리’ 앞에 을이 된 조선사
헤비테일이란 이름 그대로 꼬리가 무거운 대금지급법이다. 선수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박건조 후반기 또는 인도 시점에 선박대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헤비테일로 계약할 경우 선주들은 초기 대금 지급 부담이 경감된다. 고부가가치 선박이나 해양플랜트는 건조비용만 수천억에서 조단위를 오간다. 선주들은 고액의 비용 정산을 인도시점까지 최대한 미뤄둠으로써 경기 변동에 따른 유리한 재무관리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조선업체들로서는 불리한 계약방식이다. 선수금 유입이 늦어지면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이나 차입 등 외부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이 헤비테일 계약에 선뜻 나선 것은 국내 조선 3사간 매출경쟁 영향이 컸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임원은 “국내 조선사 기술력은 세계 수위다. 국내 업체끼리 충분히 과점시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경영진이 저가수주를 남발하는 등 괜한 욕심을 부렸다”며 “이 탓에 헤비테일 계약을 남발하며 매출만 올렸고, 결국 다음 경영진으로 폭탄돌리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3사 중 자금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대우조선은 헤비테일 탓에 사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본사 건물을 매각하는 등 자금 확충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수조원의 돈줄인 해양플랜트 인도가 지연되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3년 '소난골 드릴십' 2척을 총 1조3000억원에 계약하면서 1조원 가량을 선박인도 시점에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헤비테일이었다. 다음달 말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인도 시 자금난에 숨통을 틔게 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근 선주사가 자금대출 문제로 인도를 거부했다.
대우조선 측은 "플랜트 인도가 약간 지연되더라도 버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 자금사정이 녹록치 못하다. 4조2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던 채권단은 이중 1조원을 노동조합 파업 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9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4000억원이다. 상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 조선사 경영진 근시안적 시각 버려야
정성립 대표는 21일 내부회의를 갖고 "소난골 인도자금 1조원이 연내 들어오는 것이 불확실해 보이며 자금 확보 실패 시 9월 만기 회사채를 못 막게 돼 STX조선해양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서울 중구 본사 사옥과 당산동 사옥 매각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오는 8월까지 2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 그리스에서 수주한 선박 4척에 대한 선수금 700억원이 곧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과 다음달 해양플랜트 2기가 인도되면 2500억원을 받게 되며, 2014년 카자흐스탄에서 수주한 해양플랜트에 대한 최종 투자승인이 나면 선수금 약 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지금의 위기론은 다소 과장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우조선 경영진의 ‘근시 경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헤비테일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둔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탓에 계약 당시에는 효자로 불렸던 송가 프로젝트부터 소난골이 되레 재앙이 돼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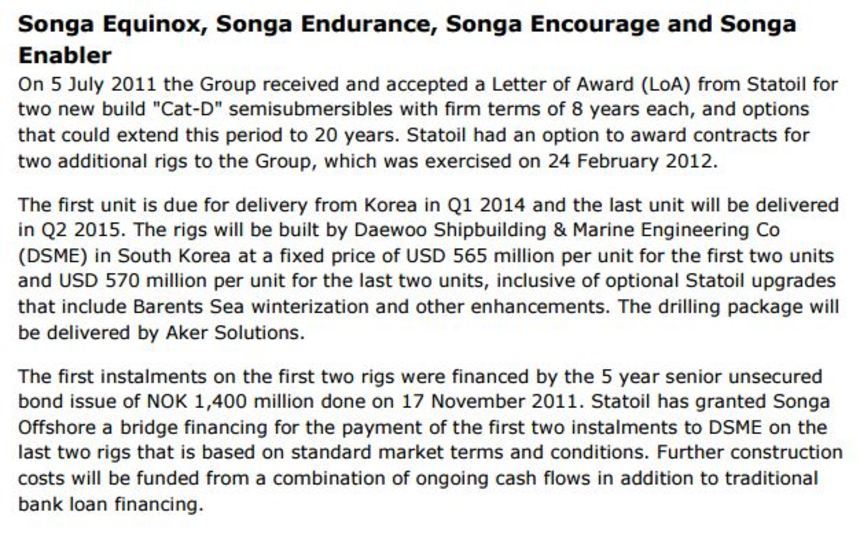
대우조선은 2011년 9월 송가오프쇼어(Songa Offshore)로부터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한 반잠수식 시추선 4기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3년간 5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송가프로젝트 설계변경만 110차례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상승분은 모두 대우조선이 부담해야 했다. 대우조선이 계약 당시 명시한 ‘a fixed price’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문구는 송가 오프쇼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11년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첫 번째 인도한 해양구조물 1기를 약 6565억원에 인도했다. 대우조선이 1기를 만드는데 투입한 비용은 약 1조원이다. 약 4000억원 적자였다. 2, 3, 4호기에서도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원가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송가 측에 요청하는 중재안을 영국 법원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향후 경영진이 고도화된 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 수주에 눈이 멀어 계약 조항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헤비테일을 단행할 경우, 언제든 제2·3의 송가 프로젝트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선사 경영자들이 세계화가 덜 돼있다. 그렇다보니 불리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당한 결과”라며 “이제는 고도화된 계약을 해야 한다. 약삭빠른 외국기업 경영자들과 싸울 때도 당하지 않도록 전문 경영자를 길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오일메이저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